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문신 시인 - 김도수 시집 ‘진뫼 오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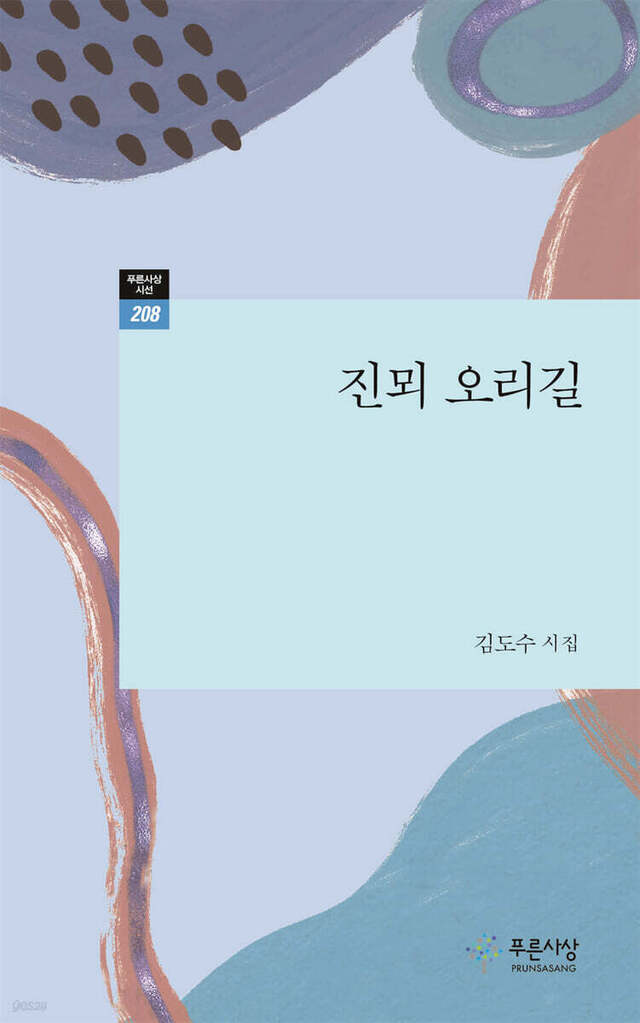
당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고개를 끄덕인다면 기억의 힘도 인정할 것이다. 우리 영혼은 기억의 힘으로 살아가고, 빛나는 기억일수록 영혼을 맑게 드러내는 법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자기 기억으로 빛나는 영혼을 여럿 만났다. 그중에는 김도수 시인도 있다. 그의 시집 <진뫼 오리길>을 읽고 더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오롯이 기억의 힘으로 빛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 영혼은 모든 기억을 한 편의 시처럼 간직한다는 사실을.
김도수 시인의 시집을 펼치면 먼저 「물수제비」라는 시가 나온다. 그 시에서 나는 “새벽까지//명치끝에//잔물결만//출렁출렁”이라는 구절을 남달리 좋아한다. 잔잔한 물결 위로 날려 보낸 납작한 돌멩이가 통통통 튀는 느낌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명치끝”이라는 말과 “잔물결”이라는 말을 남몰래 어루만지곤 한다. 그 말에는 삶을 향한 진심이 있고, 매 순간을 간절하게 살아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잔여가 배어 있다. 잔여라는 말이 낯설다면 여운이라는 말도 좋겠다. 지나갔지만 아직 남아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 같은 것. 시는 그 실낱같은 희망을 고르고 골라 엮은 영혼의 심장 같은 거다.
이런 시도 인상적이다. “세상 올곧게 살려거든/삼시 세끼 밥 먹듯이/강물에 얼굴 비춰보며/물색 있게 살 일이다” 「물색없이」라는 시의 부분인데, 나는 이 시를 읽고 ‘물색’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거나 고르는 일’이라는 심심한 대답을 읽고 실망했다. 그래서 나름으로 물색이라는 말을 이렇게 고쳐 생각해 보았다. 물색이란 사물 각각의 고유한 빛깔을 찾아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세상 올곧게 사는 일이란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는 존재의 고유한 색채를 읽어내는 일이 아닐까?
이번에는 시 한 편을 오롯이 읽어보자.
허기진 배가 쑥 들어간 달이/배고픈 지상의 뭇 생명들/홀쭉한 배 위에 올려놓고/밤새 잠이 들었다
「초승달」이라는 이 시는 초승달만큼이나 간결하고 짧다. 하지만 보름달보다 크고 환하고 풍요롭다. “허기진 배”가 품고 있는 “뭇 생명들”을 상상해 보라. 뭔가 아릿한 게 명치끝에서 꿈틀거린다면 이 시를 절반만 감상한 셈이다. 척박한 대지에서도 생명은 자란다. 초승달은 “배고픈” “생명들”을 품고 “잠이 들”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어느새 세상 무엇보다 크고 둥근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이 시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농사꾼이 모종을 키우는 일의 정확한 은유다. 그리고 이 시는 시인 김도수가 시심을 일구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내가 알기로 시는 시인이 세상 허기진 것들을 밤새 품어 생명을 부여한 것들이다. 따라서 시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마다 시인의 기억들이 물색 있게 자리한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 시구를 마저 읽어야 한다. “등 따숩게 햇볕 내리쬐는 날/그대가 업고 강을 건너온 슬픔이/세상 길 끝을 걸어갈 때”(「강을 건너온 슬픔」) 그가 남긴 잔여의 발자국을 떠올려 보라. 우리도 저마다의 슬픔을 업고 세상 길 끝으로 나서야 하는 건 아닐까? 김도수 시인의 시집 <진뫼 오리길>은 그런 물음을 던진다. 그에 응답하듯 우리 영혼의 기억들이 슬픔의 윤슬로 반짝거린다. 이것이 김도수 시인의 시집을 거듭 읽고 난 잔여다.
문신 작가는
2004년 전북일보와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죄를 짓고 싶은 저녁>, 동시집 <바람이 눈을 빛내고 있었어>, 평론집 <서로의 표정이라서> 등을 냈다.






 홈
홈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