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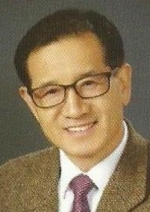
“이웃집 할망구가 날 보더니/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쓰면서/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 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 제.”
83세의 늦깎이 나이로 한글을 깨우친 어느 할머니의 ‘내 기분’이라는 시다. 이 시 속에는 웃음 가득한 할머니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내내 빙그레 웃음 짓게 한다. 인생을 ‘다시’ 산다는 기분에 얼마나 좋을까?
한동안 뜸했던 아내가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었다. 그것이 뭐 그리 대단 할까마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대단하다. 인생에서 ‘다시’라는 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의 아내를 보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다시”라는 말이 새삼 고맙다.
세월을 살다보면 어떤 인생이라도 쓰러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은 자기 몫이다. 어린이들이야 부모가 일으켜 세우지만 성인이 된 우리를 누가 다시 일으켜 주겠는가? 그 ‘다시’ 일어남이 인생이라 말하고 싶은 이유는 주변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죽은 사람들을 흔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나 다시 일어서리라/더 이상 여기서 슬퍼할 수만 없어/ 어제까지 아픈 가슴 넓은 품에 맡겨버리고/두손을 굳게 잡고/나 다시 일어서리라/오 저 높은 곳 바라보며 나 다시 일어서리라.”
이 복음 성가의 ‘다시’는 나와 아내의 반면교사가 되었다.
좋은 선생님은 과연 누구일까? 야단치며 채찍 하는 선생님인가. 아니면 ‘괜찮아, 다시 해보자’고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나는 당연히 후자 쪽이라 생각한다. 가수는 한 곡의 노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을 다시 부르고 또 부른다.
소녀시절 가수를 꿈꾸었던 나의 아내는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목소리가 변하여 노래는커녕 대화도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 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이 따랐다. 가장 큰 것은 좌절과 함께 찾아온 존재적 상실감이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노래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게 행복이었을 텐데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서러움이 질곡의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 쉰 목소리에 갈라진 음성은 좌절하는 실망의 도를 넘었다. 관광을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불안으로 몸을 떨기도 했다.
언젠가 TV에서 국민 가수라 불리는 어느 대중 가수가 지금은 회복이 되었지만 한 때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노래를 부르지 못해 얼마나 갑갑했던지 자살까지 하고 싶었다는 심경을 털어 놓았다. 나는 순간 곁에 있던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가수가 아내의 고통을 대변한 셈이다.
나는 순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아내의 노래를 찾아주기로 결심하고 아내의 노래 선생을 자청했다. ‘여보! 좋아요. 다시 한 번 불러 봐요’ 하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때로는 아내가 신경질을 내기도 했으나 무시하고 나는 수없이 ‘다시’를 외쳤다.
드디어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된 아내의 노래 속에서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이 실감났다. 아내는 작년 군산의 작은 콘서트홀에서 상을 받더니 이제는 더 큰 무대로 나서기 시작했다. 노래하는 아내의 모습이 더욱 빛났다. ‘다시’ 라는 말이 지금은 내 아내 인생의 행복을 채워주고 있다. 만약 ‘다시’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아니 ‘다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 아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인생이 즐겁고 ‘다시’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은 내일의 꿈이기도 하다. 이 같은 기쁨이 아내의 육십 인생을 새롭게 달구고, ‘다시’ 일어섬에 대한 감사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다시”라는 말을 되새겨 보며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성덕 수필가는 대한문학회 이사이자 행촌수필 회원으로 신아문예대학 수필 창작반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필집 〈단 하루만이라도〉를 펴냈다.
금요수필
바람 앞의 꽃잎처럼 걷고싶다 산행하던 날 앵두나무의 추억 금쪽같은 부모님 거울 속의 거울 산책길에서 기운을 받는다 탑사와 어울린 봄날 신발에 대한 애증 금고에 갇힌 신사임당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